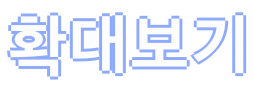이효석의들총평
이효석의들총평

이효석의들총평

들
이효석
줄거리
1
들은 온통 초록이 짙게 덮여 벌써 한 조각의 흙빛도 찾아 볼 수 없다. 초록의 바다. 눈이 보얗게 깔렸을 때에는 흰빛과 능금 나무의 자줏빛과 그림자의 옥색빛밖에 없어 단순하기 옷 벗은 여인의 나체와 같던 것이 봄은 옷 입고 치장한 여인다.
야들야들 나부끼는 초록의 양자는 부드럽게 솟는 음악. 줄기는 굵고 잎은 연한 멜로디의 마디마디이다. 부피 있는 대궁은 나팔 소리요. 가는 가지는 거문고의 울률이라고나 할까. 알레그로가 지나고 안단테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 그것이 봄의 걸음이다. 꽃 다지, 질경이 민들레 가지 가지 풋나물을 뜯어 먹으면 몸이 초록으로 물들 것만 같다.
새가 지저귄다. 꾀꼬일까.
지평선이 아롱거린다.
들은 내 세상이다.
2
들에 찾아 온 봄을 찬미하여, 나는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사람의 지혜란 결국 신비의 테두리 를 뱅뱅 돌 뿐이요, 조화 속의 언제까지나 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일 듯 싶다. 초록풀에 덮힌 땅 속의 뜻은 초록옷을 입은 여자의 마음과도 같이 엿볼 수 없는 저 건너 세상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들을 밥과 책만큼 좋아하게 되었다. 사람은 들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과 벗하게 됨은 생활에서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까. 식물적 애정은 반드시 동물적 열정이 진한 곳에 오는 것일까 그러나 동무들과 골방에서 만나고 눈을 기어 거리를 돌아치다 붙들리고 뛰다 잡히고 쫓기고 -- 하였을 때의 열정이나, 지금의 들을 사 랑하는 열정이나 일반이다. 신념에 목숨을 바치는 영웅이라고 인간 이상이 아닐 것과 같이 들을 사랑하는 졸부라고 인간 이하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퇴학 맞고 처음으로 도회를 쫓겨 내려왔을 때에 첫걸음으로 찾은 곳은 일가집도 아니요, 동무집도 아니요, 실로 이 들이었다.
3
....
이효석
줄거리
1
들은 온통 초록이 짙게 덮여 벌써 한 조각의 흙빛도 찾아 볼 수 없다. 초록의 바다. 눈이 보얗게 깔렸을 때에는 흰빛과 능금 나무의 자줏빛과 그림자의 옥색빛밖에 없어 단순하기 옷 벗은 여인의 나체와 같던 것이 봄은 옷 입고 치장한 여인다.
야들야들 나부끼는 초록의 양자는 부드럽게 솟는 음악. 줄기는 굵고 잎은 연한 멜로디의 마디마디이다. 부피 있는 대궁은 나팔 소리요. 가는 가지는 거문고의 울률이라고나 할까. 알레그로가 지나고 안단테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 그것이 봄의 걸음이다. 꽃 다지, 질경이 민들레 가지 가지 풋나물을 뜯어 먹으면 몸이 초록으로 물들 것만 같다.
새가 지저귄다. 꾀꼬일까.
지평선이 아롱거린다.
들은 내 세상이다.
2
들에 찾아 온 봄을 찬미하여, 나는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사람의 지혜란 결국 신비의 테두리 를 뱅뱅 돌 뿐이요, 조화 속의 언제까지나 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일 듯 싶다. 초록풀에 덮힌 땅 속의 뜻은 초록옷을 입은 여자의 마음과도 같이 엿볼 수 없는 저 건너 세상이다. 나는 언제부턴가 들을 밥과 책만큼 좋아하게 되었다. 사람은 들 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과 벗하게 됨은 생활에서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까. 식물적 애정은 반드시 동물적 열정이 진한 곳에 오는 것일까 그러나 동무들과 골방에서 만나고 눈을 기어 거리를 돌아치다 붙들리고 뛰다 잡히고 쫓기고 -- 하였을 때의 열정이나, 지금의 들을 사 랑하는 열정이나 일반이다. 신념에 목숨을 바치는 영웅이라고 인간 이상이 아닐 것과 같이 들을 사랑하는 졸부라고 인간 이하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퇴학 맞고 처음으로 도회를 쫓겨 내려왔을 때에 첫걸음으로 찾은 곳은 일가집도 아니요, 동무집도 아니요, 실로 이 들이었다.
3
....

-
 이효석의화분花粉
이효석의화분花粉
화분(花粉) 지은이 이효석 (1907~1942) 1928년 단편 <도시와 유령>을 《조선지광》에 발표하여 문단에 등장. 한때는 동반자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활동을 했으나 그 후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 -
 메밀꽃 피는 마을 장터기행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중 허생원과 동이가 당나귀를 몰고 찾던 장터를 가다)
메밀꽃 피는 마을 장터기행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중 허생원과 동이가 당나귀를 몰고 찾던 장터를 가다)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신청을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그대로 사용하실수있습니다 ❐ “효석문화제”참관, 메밀꽃 피는 마을 순방 ❐ 허생원․조선달․동이가 거쳐간 봉평장.. -
 들을 읽고
들을 읽고
이효석 소설 들 감상 이효석의 소설 들은 어느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관능과 자연과의 친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소설을 가장 시처럼 표현한다는 표현을.. -
 이효석의산총평
이효석의산총평
산 이효석 줄거리 중실은 나무하던 손을 쉬고 산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본다. 산에 있는 갖가지의 나무에서 배어나오는 향기를 마시면서 산냄새가 피부에 배는 것을 느낀다. 별안간 부드득 힘을 느끼며, 그 .. -
 이효석 <화분> 연구
이효석 <화분> 연구
이효석 <화분>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Ⅰ.들어가며 Ⅱ. 작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Ⅲ. <화분>의 작품적 특성 1.작품.. -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의 단편소설로 1936년에 발표되었으며 원래 이효석이 발표한 제목은 모밀꽃 필 무렵 이다. 교과서에도 실렸으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었을 정도로 인지도 있는 작품이며 배경인 봉.. -
 이효석 소설돈(豚) 감상
이효석 소설돈(豚) 감상
이효석 소설 돈(豚) 감상 이효석의 단편소설 돈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애욕을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낭만주의 계열의 소설이다. 어느 시골의 종묘장에서 건널목에 이르는 길을 배경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감자원작과영상의비교
감자원작과영상의비교
‘감자’, 원작과 영상의 비교 김동인의 작품의 주는 현실성에 있다. 그의 작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평면적인 성격의 등장 인물은 그의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입체적 성격의 창조. ‘감자’에.. -
 메밀꽃 필 무렵 평설
메밀꽃 필 무렵 평설
1. 서론 1930년대는 한국 문학(韓國文學)에 있어서 암울한 시기였다. 일제의 탄압과 강제적인 조치로 인해 순수 문학 작품(純粹文學作品)만 발표될 수 있었고 많은 작가가 절필을 하는 등 그야말로 암흑기라 할 .. -
 메밀꽃필무렵 원작과tv비교
메밀꽃필무렵 원작과tv비교
-메밀꽃 필 무렵. 원작과 TV의 비교-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나도 중학교 때 읽어 본 적이 있고, 시험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던 작품들 중 하나였다. 그런 <메밀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