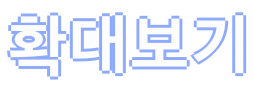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독후감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독후감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독후감

<그 많던 싱아...>와 <그 산...>을 읽고
국민학교 시절... 방학만 되면 항상 무수히 쏟아지던 과제들. 꼭 개학식이 다 되어서야 허둥지둥하던 그 유년 시절의 고통스런 기억을 아직도 난 생생히 기억한다. 그렇다고 해서 6년 내내 그 전전긍긍의 시절을 보낸 건 아니다. 해가 지날수록 인간이란게 요령만 잔뜩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별 부담을 못 느꼈으니 말이다.
하지만 유독 그 중에서도 도저히 체질상 면역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독후감이다. 독후감! 도대체가 책을 읽는다는 자체로도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시절에 그걸 읽고 속내를 토해내란 건 그 시절 나에게 있어선 비극을 넘어선 악몽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병적으로 책읽기를 기피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독후감’이란 말 자체만 들어도 살이 떨리는 걸로 보아 독서는 나란 놈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부인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덧 중학교에 들어가서 방학숙제로 독후감의 ‘독’자도 구경하지 못했을 때의 그 기쁨은 뭐랄까 박완서의 말에 빗대어 ‘초여름 첫 새벽에 달개비가 깔린 푸른 길의 이슬을 맨발로 밟을 때처럼 순수한 희열’ 이랄까. 아무튼 더욱더 교과서 외의 책엔 관심 밖이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정도 무딜대로 무뎌졌을 때 난데없이 고2 때 복병을 만나버렸다. 국어선생이었던 그는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새로운 교육적 궤도를 걸어가면서 독후감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때 그 복병이 처음 던져준 과제는 박완서의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라는 장편 소설로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생각나는 거라고는 ‘미친놈, 따뜻하긴 지랄로 따뜻해! 책은 더럽게 두껍네.’라고 말했다가 어떤 친구에게 작가가 여자란 말은 듣고 ‘정신나간 년’이라고 수정한 기억밖에 남은 게 없다. 그만큼 완서와의 첫 만남은 네거티브 했기 때문에, 거의 몇 년 만에 독후감으로 쓰는 책의 저자가 또다시 박완서란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
국민학교 시절... 방학만 되면 항상 무수히 쏟아지던 과제들. 꼭 개학식이 다 되어서야 허둥지둥하던 그 유년 시절의 고통스런 기억을 아직도 난 생생히 기억한다. 그렇다고 해서 6년 내내 그 전전긍긍의 시절을 보낸 건 아니다. 해가 지날수록 인간이란게 요령만 잔뜩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별 부담을 못 느꼈으니 말이다.
하지만 유독 그 중에서도 도저히 체질상 면역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독후감이다. 독후감! 도대체가 책을 읽는다는 자체로도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시절에 그걸 읽고 속내를 토해내란 건 그 시절 나에게 있어선 비극을 넘어선 악몽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병적으로 책읽기를 기피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독후감’이란 말 자체만 들어도 살이 떨리는 걸로 보아 독서는 나란 놈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부인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덧 중학교에 들어가서 방학숙제로 독후감의 ‘독’자도 구경하지 못했을 때의 그 기쁨은 뭐랄까 박완서의 말에 빗대어 ‘초여름 첫 새벽에 달개비가 깔린 푸른 길의 이슬을 맨발로 밟을 때처럼 순수한 희열’ 이랄까. 아무튼 더욱더 교과서 외의 책엔 관심 밖이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정도 무딜대로 무뎌졌을 때 난데없이 고2 때 복병을 만나버렸다. 국어선생이었던 그는 이제까지 본 적 없었던 새로운 교육적 궤도를 걸어가면서 독후감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때 그 복병이 처음 던져준 과제는 박완서의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라는 장편 소설로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생각나는 거라고는 ‘미친놈, 따뜻하긴 지랄로 따뜻해! 책은 더럽게 두껍네.’라고 말했다가 어떤 친구에게 작가가 여자란 말은 듣고 ‘정신나간 년’이라고 수정한 기억밖에 남은 게 없다. 그만큼 완서와의 첫 만남은 네거티브 했기 때문에, 거의 몇 년 만에 독후감으로 쓰는 책의 저자가 또다시 박완서란 걸 알았을 때 그 충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독후감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줄거리 소개 및 등장인물분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에서 인상깊었던 장면 및 읽고나서 느낀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독후감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줄거리 소개 및 등장인물분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에서 인상깊었던 장면 및 읽고나서 느낀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줄거리 소개 및 등장인물분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에서 인상깊었던 장면 및 읽고나서 느낀점에 대해 서술한 독후감 입니다. 독후감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 -
 [독후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를 읽고
[독후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를 읽고
책 제목: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저 자: 박완서 1. 이 책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쓰세요 박완서라는 작가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 왔었고 그녀의 책 중 아주 오래된 농담이나 꼴찌에게 보내는..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핵심 줄거리 및 작가 메시지분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고 새롭게 알게된 점과 느낀점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독후감,서평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핵심 줄거리 및 작가 메시지분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고 새롭게 알게된 점과 느낀점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독후감,서평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핵심 줄거리 및 작가 메시지분석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고 새롭게 알게된 점과 느낀점에 대해 작성한 독후감 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내용분석과 요약을 토.. -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감상문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감상문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감상문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 -
 박완서의「그많던싱아는누가다먹었을까
박완서의「그많던싱아는누가다먹었을까
<독서 감상문> 박완서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의「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소설을 거의 접해 보지 않았던 시절 이 소설을 읽게 되었다. 제목만으로는 어떤 소설이란 것을 .. -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감상문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감상문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감상문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도 우리들 앉혀 놓고 하시.. -
 그많던싱아는누가다먹었을까
그많던싱아는누가다먹었을까
'그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를 읽고... 요즘 인기 방영프로인 '느낌표'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에서 소개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실상 그 프.. -
 [국문학] 박완서의 나목에 관한 작품 설명 및 작가 박완서의 작품세계에 관해서
[국문학] 박완서의 나목에 관한 작품 설명 및 작가 박완서의 작품세계에 관해서
[국문학] 박완서의 나목에 관한 작품 설명 및 작가 박완서의 작품세계에 관해서 1.작품명 나목(裸木) 2. 작가 소개 박완서(朴婉緖, 1931~ 2011년 1월 22일 ) 경기도 개풍 출생. 서울대 국문과 중퇴. 197.. -
 그많던 싱아는 누가다먹었을까
그많던 싱아는 누가다먹었을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처음에 이 책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제목만큼이나 다른 책에 비해 색다른 느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느낌에서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싱아란 풀종류의 일종이였다.. -
 독후감,서평 27권 135페이지 분량 (국부론,총균쇠,선량한 차별주의자,자유론,동물농장,에밀,논어,이기적 유전자 등등 독후감 모듬)
독후감,서평 27권 135페이지 분량 (국부론,총균쇠,선량한 차별주의자,자유론,동물농장,에밀,논어,이기적 유전자 등등 독후감 모듬)
독후감,서평 27권 135페이지 분량 모듬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국부론 서평 (2) 자유론 서평 (3) 화폐전쟁 서평 (4) 파피용 서평 (5) 침묵의 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