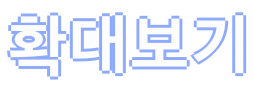삼국유사 - 일연
삼국유사 - 일연

삼국유사 - 일연

삼국유사 - 일연
살아가면서 가끔은 남과 달라지고 싶을 때가 있다. 남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다. 특히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라는 집단에 관한 문제가 되면 더욱 그렇다.
일찍부터 자본주의 길을 걸어온 서구 사회의 상업주의 문화 앞에서 어쩐지 위축되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도 장구한 역사와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마음만은 풍족하게 살아온 민족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러나 막상 무엇이 우리 것인가라고 말할라치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서는 문화의 고유성을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양과도 확실히 다르고 중국과도 다른 우리의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역사의 어디까지 올라가야 순수한 우리만의 숨결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길에서 처음 만나야 하는 책이 바로 삼국유사다.
삼국유사 속에는 우리 민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책을 읽다보면 언젠가 할머니에게서 한번쯤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적은 없지만 구절구절이 낯설지가 않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겨울 삭풍이 문풍지를 세차게 울리는 한밤중에 읽는 것이 좋다. 온돌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흙벽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삼국유사가 주는 신비감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우리 민족이 먼 옛날 도읍을 정하고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녀 왔던 심성과 습속(習俗)이 행간마다 배어 있다. 그래서 나는 삼국유사를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야사(野史)쯤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단순히 그 이전 시대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
살아가면서 가끔은 남과 달라지고 싶을 때가 있다. 남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다. 특히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라는 집단에 관한 문제가 되면 더욱 그렇다.
일찍부터 자본주의 길을 걸어온 서구 사회의 상업주의 문화 앞에서 어쩐지 위축되어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도 장구한 역사와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마음만은 풍족하게 살아온 민족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그러나 막상 무엇이 우리 것인가라고 말할라치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서는 문화의 고유성을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서양과도 확실히 다르고 중국과도 다른 우리의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역사의 어디까지 올라가야 순수한 우리만의 숨결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길에서 처음 만나야 하는 책이 바로 삼국유사다.
삼국유사 속에는 우리 민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책을 읽다보면 언젠가 할머니에게서 한번쯤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적은 없지만 구절구절이 낯설지가 않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겨울 삭풍이 문풍지를 세차게 울리는 한밤중에 읽는 것이 좋다. 온돌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흙벽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삼국유사가 주는 신비감이 한데 어우러져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우리 민족이 먼 옛날 도읍을 정하고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녀 왔던 심성과 습속(習俗)이 행간마다 배어 있다. 그래서 나는 삼국유사를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야사(野史)쯤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단순히 그 이전 시대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

-
 삼국유사 심층분석과 인물분석및 삼국유사 줄거리 내용요약과 삼국유사
삼국유사 심층분석과 인물분석및 삼국유사 줄거리 내용요약과 삼국유사
:삼국유사: 심층분석 인물분석 내용정리 독후감 [목차] 1. 삼국유사에 대해 2. 삼국유사 인물분석 3. 삼국유사의 인물상 (1) 남성상 (2) 여성상 4. 삼국유사 줄거리와 내용요약 5. 삼국유사를 읽고난후 (독.. -
 삼국유사에 나타난 고대의 언어신성관
삼국유사에 나타난 고대의 언어신성관
삼국유사에 나타난 고대의 언어신성관 普覺國尊 一然의 「三國遺事」(1285)는 金富軾의 「三國史記」(1145)와 더불어 고대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특히나 「三國遺事」에는 많은 巫俗神話가 실려.. -
 사학과 - 세계적 석조문화유산 석굴암
사학과 - 세계적 석조문화유산 석굴암
세계적 석조문화유산 석굴암 서론 세계적인 석조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할만한 석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된다. 그랬을 때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처음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석굴암이었다. .. -
 안동하회마을을찾아가며
안동하회마을을찾아가며
내가 가보았어도 이번처럼 열심히 안동지역을 공부해 다니는 건 첨이다. 물론 교양과목의 학점을 따기 위해서도 있지만 안동지역 우리 문화재들을 한 번 공부하고 싶었다. 우리가 제일로 처음 가본 곳은 인각사.. -
 단군
단군
◈목차◈ Ⅰ. 고조선의 단군신화 1. 신화적 특성 2. 단군신화의 인식에 대한 객관성의 문제 Ⅱ. 고구려의 주몽신화 1. 주몽신화의 특징 2. 주몽신화의 심층적 분석 (1)부여건국신화 = 고구려건국신화 (2) 주몽.. -
 건국신화
건국신화
세계의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과거 역사상의 각 왕조에 관한 ‘건국신화’들이 전한다. 그중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상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관한 것인 만큼 오늘날에는 민족 전체의 대표적인 신.. -
 단군신화에대해
단군신화에대해
세계의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도 과거 역사상의 각 왕조에 관한 ‘건국신화’들이 전한다. 그중 단군신화는 우리 역사상에 등장한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관한 것인 만큼 오늘날에는 민족 전체의 대표적인 신.. -
 한국고대사 참고문헌 목록
한국고대사 참고문헌 목록
한국고대사 참고도서 목록 (홍익대 김태식 교수님 작성) 1. 기본사료 I. 한국사서 金富軾, 1145, ≪三國史記≫ 一然, 1278~1289, ≪三國遺事≫ 金宗瑞‧鄭麟趾外, 1451, ≪高麗史≫地理志. 朝鮮王朝實錄廳, 1454, ≪世宗.. -
 삼국유사 연구
삼국유사 연구
『목차』 1.<<三國遺事>>란 2.<<三國遺事>>의 해제 3.일언 찾기와 <<三國遺事>> 이해하기 (1)일언이라는 사람 (2)일언의 歷史意識 (3)<<三國遺事>>의 체재와 내용 (4)당시의 歷史意識 (5)<<三國遺事>>.. -
 삼국유사 독후감 - 삼국유사 책 소개 및 내용요약 및 삼국유사를 읽고나서 인상깊은내용과 느낀점
삼국유사 독후감 - 삼국유사 책 소개 및 내용요약 및 삼국유사를 읽고나서 인상깊은내용과 느낀점
삼국유사 책 소개 및 내용요약 및 삼국유사를 읽고나서 인상깊은내용과 느낀점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1. 삼국유사 소개 2. 삼국유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