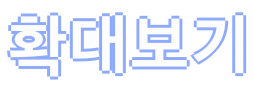서울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 1964년 겨울 - 김 승 옥 -
1965년 작품
이 글을 읽다가 문득 고등 학교 시절 친구들과 나누던 추억들이 떠올라 미소 짓게 하였다. 무엇이든 의미를 두던 시절의 얘기들.... 언어적 장난과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지금은 한낱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 나와 친구들은 섣부른 언어적 유희로 모든 진실과 진리를 깨우치려 했다. 이 글 속에 김이 버스에 탄 한 여인의 아랫배의 움직임을 사랑하듯 우리들 역시 그런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며 남들이 깨우치지 못한 도를 깨우친 양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이 글은 지금의 소설들에 비한다면 글세 약간의 풋풋한 냄새마저도 나는 작품이다. 현재의 한국 소설들이 극도로 reality에 충실하여 허구적 냄새가 들 한다고 생각 한다면 이 작품은 읽으며 '이건 소설 속의 이야기야.'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은 없다. 글세 60년대에는 이런 줄거리들이 사실적으로 받아 들여졌을 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글에서는 풋내가 난다. 어떤 대학생 아니 문학을 꿈꾸는 문학 소년들이 습작으로 쓴 작품과 같은 풋풋함이 배여 있다. 그런데 이 글에 애착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의 추억과 어우러져서 일까 아니면 글 자체가 역시 명작이기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걸까
<줄거리>
육군사관하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 대학원에 다니고 부잣집 아들인 안과 자신의 부인의 시체를 병원에 판 30대 가난뱅이 사내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게 된다.
김은 먼저 안과 만났다. 그들은 파리와 꿈틀거림에 대해 얘기하다 결국 자신만이 아는 사실 즉'지난 십 사 일 저녁에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두 장 있다' 따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
1965년 작품
이 글을 읽다가 문득 고등 학교 시절 친구들과 나누던 추억들이 떠올라 미소 짓게 하였다. 무엇이든 의미를 두던 시절의 얘기들.... 언어적 장난과 사소한 것에서도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지금은 한낱 추억이 되었지만 당시 나와 친구들은 섣부른 언어적 유희로 모든 진실과 진리를 깨우치려 했다. 이 글 속에 김이 버스에 탄 한 여인의 아랫배의 움직임을 사랑하듯 우리들 역시 그런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며 남들이 깨우치지 못한 도를 깨우친 양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이 글은 지금의 소설들에 비한다면 글세 약간의 풋풋한 냄새마저도 나는 작품이다. 현재의 한국 소설들이 극도로 reality에 충실하여 허구적 냄새가 들 한다고 생각 한다면 이 작품은 읽으며 '이건 소설 속의 이야기야.'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은 없다. 글세 60년대에는 이런 줄거리들이 사실적으로 받아 들여졌을 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글에서는 풋내가 난다. 어떤 대학생 아니 문학을 꿈꾸는 문학 소년들이 습작으로 쓴 작품과 같은 풋풋함이 배여 있다. 그런데 이 글에 애착이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의 추억과 어우러져서 일까 아니면 글 자체가 역시 명작이기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걸까
<줄거리>
육군사관하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는 김은 대학원에 다니고 부잣집 아들인 안과 자신의 부인의 시체를 병원에 판 30대 가난뱅이 사내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게 된다.
김은 먼저 안과 만났다. 그들은 파리와 꿈틀거림에 대해 얘기하다 결국 자신만이 아는 사실 즉'지난 십 사 일 저녁에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두 장 있다' 따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

-
 [한국문학발표] 김승옥 - 서울, 1964년 겨울
[한국문학발표] 김승옥 -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 서울, 1964년 겨울 이번 수업의 많은 분들의 발표 작품 중 저는 유독 김승옥 작가님의 서울, 1964년 겨울 작품이 와 닿았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가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사회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기 .. -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 -
 서울1964년겨울
서울1964년겨울
서울, 1964년 겨울 지은이 김승옥 1962년 단편 <생명연습>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 그는 이러한 시대적 체험을 소설화하기 시작한다 . 대표작으로는 <무진기행> <건> <환상수첩> <서울.. -
 [서평] 카론의 동전 한 닢
[서평] 카론의 동전 한 닢
* 카론의 동전 한 닢 저자: 정갑영 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출판년도: 2005년 8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인간이 죽어 저승에 가서 저승의 신인 하데스의 궁전에 들어가려면 ‘비통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 -
 버클리 자유운동
버클리 자유운동
문학 석사 학위 논문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 민권 옹호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국문 초록 1964년의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을 다루는 이 글의 주된 관심은 자유 언론 운동과 민권 운동 사이의 관계이.. -
 만세전
만세전
[만세전(萬歲前)] ※핵심 사항 정리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구성: 순차적 구성 -성격: 사실주의적, 현실 비판적, 소시민적 -배경: 31운동전인 1918년 겨울(시간적), 동경과 서울(공간적) -주제: 일제 강점 하.. -
 [독후감]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고나서
[독후감]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고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를 읽고나서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3년 전 겨울이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역작이라는 소개와 함께,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몇 년간 인기 대출도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야.. -
 서울의 비대화 현상에 대하여
서울의 비대화 현상에 대하여
서울의 비대화 현상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서울은 조선시대 5백년의 도읍지였고 현재는 우리 나라의 수도이다. 중앙집권적인 조선왕조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 -
 서울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지방 도시침체의 문제에 대하여
서울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지방 도시침체의 문제에 대하여
서울의 비대화와 이에 따른 지방도시 침체의 문제와 해결책 1. 들어가며 서울은 조선시대 5백년의 도읍지였고 현재는 우리 나라의 수도이다. 중앙집권적인 조선왕조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
 저가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제주항공,저가항공,저가항공사,저가항공시장,제주항공,진웨어,이스타,티웨이,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저가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제주항공,저가항공,저가항공사,저가항공시장,제주항공,진웨어,이스타,티웨이,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환경분석론] 저가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제주항공 목 차 Ⅰ. 항공 산업의 현황과 중요성 Ⅱ. 제주항공의 역사와 창설 배경 및 현황 Ⅲ. 제주항공의 전략 분석 Ⅳ. 제주항공의 경쟁자 분석 Ⅴ. 대응과 미래 Q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