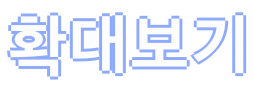안도현의 관계를 읽고 쓴 감상문
안도현의 관계를 읽고 쓴 감상문

안도현의 관계를 읽고 쓴 감상문

이 책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사람, 동물과 자연 등 많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 자신이 '소설과 동화와 에세이와 시의 중간 어디쯤'이라고 이 글의 성격을 소개하고 있다. 어떤 글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하는 그의 글에서 난 자유를 느끼고, 일탈에 대한 약간의 대리 만족을 경험한다. 어둠 속에서 느끼는 한 줄기 빛처럼 나의 마음을 감싸는 그의 많은 글 중 나의 시선을 가장 오래 끌었던 글은 '버들치를 기르는 시인'이라는 글이다.
초라하게 떨리는 선풍기 두 대가 전부인 학교에서 땀 뻘뻘 흘리며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내 뇌리 속을 스치는 노래이다. 집 - 학교 - 학원이라는 끝나지 않는 뫼비우스의 띠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 난 그 틀이 '감옥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가고 싶지만, 그럴만한 용기와 돈이 내게는 없다. 우리의 이런 반복되는 삶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내 앞에 있다. 바로 안도현님의 '관계'라는 책이다.
시인은 시 쓰기를 좋아해서 붙여진 그의 별명이다. 그에게는 '글쟁이', '작가'같은 좋은 별명 외에도 '현실부적응자', '속없는 인간'같은 나쁜 별명도 있다. 세상은 그래 왔다. 꿈꾸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이들을 세상은 항상 백안시했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시인 같은 이들이 더 인간답고, 아름답지 않은가 이 사회에 길들여져서 이 속의 모순과 불의를 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쩌면 미운 오리 새끼를 놀리는 오리들인지도 모른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어서 아름답게 날아갈 때, 그 밑에서 꽥꽥거리며 후회하는 오리들인지도 모른다.
....

-
 연어를 읽고나서
연어를 읽고나서
연어를 읽고나서 저자는 안도현인데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원광대 국문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 -
 연어를 읽고나서
연어를 읽고나서
연어를 읽고나서 저자는 안도현인데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원광대 국문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와시학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 -
 연어감상문
연어감상문
‘연어’를 읽고... ‘연어’라는 말속에는 강물 냄새가 난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 연어라는 책의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누구나 한번쯤은 ‘연어‘라는 책제목을 들어봤을 만큼 꽤나 유.. -
 관계의 힘 독후감 감상문 서평 레이먼드 조
관계의 힘 독후감 감상문 서평 레이먼드 조
관계의 힘를 읽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독후감 감상문 서평 사이토 다카시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독후감 감상문 서평 사이토 다카시
책을 읽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5년 1인 가구 전망치는 506만 명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27.1%가 1인.. -
 [최신A+자료]암살영화감상문, 친일파문제에대한나의생각, 영화암살에대한평가및친일파문제,영화암살분석과감상평, 암살줄거리와감상문
[최신A+자료]암살영화감상문, 친일파문제에대한나의생각, 영화암살에대한평가및친일파문제,영화암살분석과감상평, 암살줄거리와감상문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독립군에 대해서 다룬 영화 암살을 보고나서 작성한 영화감상문입니다. 영화 암살의 내용 줄거리와 함께 암살 영화감상평이 적절하게 어우러졌으며 영화감상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춘 자료입니.. -
 [독후감,감상문] ‘관계의 힘’을 읽고
[독후감,감상문] ‘관계의 힘’을 읽고
[독후감, 감상문] ‘관계의 힘’을 읽고 ‘인간은 인간으로 치유된다‘,’인간이 곧 자산이다’,‘인간이 추구해야할 것은 돈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인간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 -
 관계 수업 독후감 감상문 서평 데이비드 번즈
관계 수업 독후감 감상문 서평 데이비드 번즈
책을 읽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관계 수업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
 [올해최신A+자료][가족관계영화 스텝맘영화감상문][가족관계영화스텝맘감상문][영화 스텝맘 감상문][영화 스텝맘 감상문]
[올해최신A+자료][가족관계영화 스텝맘영화감상문][가족관계영화스텝맘감상문][영화 스텝맘 감상문][영화 스텝맘 감상문]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화 스텝맘을 보고나서 작성한 감상문입니다. 내용의 줄거리와 함께 감상평이 적절하게 어우러졌으며 감상문의 형식을 제대로 갖춘 자료입니다. 또한 탄탄한 내용구성으로 직.. -
 카네기인간관계론 감상문
카네기인간관계론 감상문
카네기인간관계론 감상문 1. 저자 데일 카네기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주리 주 매리빌에 있는 한 농장에서 태어났다. 그는 네브래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