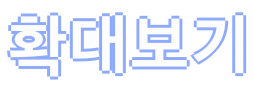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독후감] 이무석 박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읽고
[독후감] 이무석 박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읽고

[독후감] 이무석 박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읽고

[독후감] 이무석 박사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읽고
‘친밀함’이란 단어에서 풍기는 매력에 서둘러 책장을 넘겼다. 특히, 저자의 프롤로그에 맘이 묶였다.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화제가 없어도 긴장할 필요가 없으며,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그런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흥미 있어 하고 의지를 해도 편하고 그런 나를 의존적이라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간혹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섭섭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선 잘못을 지적받아도 비난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관심이 고맙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리상 떨어져 있어도 그립긴 하지만 버림 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산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서로를 믿고 그 인간됨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깊이 든다.” 란 글이었는데... 마치 대인관계에서의 유토피아를 발견한 듯 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젠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셀프(Self)가 아닌 페르조나(Persona)일 것임을 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마음의 지하실, 즉 비의식 안에 숨어있는 갈등들을 과감히 찾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성급히 책장을 넘겼던 것 같다. 그리고 정리를 하며 나름대로 소제목을 달아 분류하며 감상을 적어내려 가기로 했다.
분석에 관하여...
....
‘친밀함’이란 단어에서 풍기는 매력에 서둘러 책장을 넘겼다. 특히, 저자의 프롤로그에 맘이 묶였다.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화제가 없어도 긴장할 필요가 없으며,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그런 사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흥미 있어 하고 의지를 해도 편하고 그런 나를 의존적이라고 비난하지도 않는다. 간혹 내 부탁을 거절해도 섭섭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선 잘못을 지적받아도 비난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관심이 고맙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리상 떨어져 있어도 그립긴 하지만 버림 받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산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서로를 믿고 그 인간됨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깊이 든다.” 란 글이었는데... 마치 대인관계에서의 유토피아를 발견한 듯 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젠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셀프(Self)가 아닌 페르조나(Persona)일 것임을 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마음의 지하실, 즉 비의식 안에 숨어있는 갈등들을 과감히 찾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더욱 성급히 책장을 넘겼던 것 같다. 그리고 정리를 하며 나름대로 소제목을 달아 분류하며 감상을 적어내려 가기로 했다.
분석에 관하여...
....

-
 [독후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읽고
[독후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읽고
[독후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밀함’을 읽고 .... -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수학 독후감을 계기로 평소에 읽고 싶었던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게 되었다. 여러 곳에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도 하고, 수학하고도 관련 되어 있다고 하니 내용이 정말 궁금했다... -
 30년만의 휴식 독후감 감상문 이무석
30년만의 휴식 독후감 감상문 이무석
책을 읽고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정리했습니다.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타가 없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준수합니다. 문단 모양(왼쪽 여백 0,.. -
 사랑 삼각형의 도형적 분석, 사랑의 삼각형 이론 척도검사
사랑 삼각형의 도형적 분석, 사랑의 삼각형 이론 척도검사
사랑 삼각형의 도형적 분석, 사랑의 삼각형 이론 척도검사 사랑의 삼각형 이론은 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의 세 가지 요소는 사랑 삼각형의 세변을 구성한다. 각 변의 길이는 그 변이 대.. -
 [독후감] 자기개발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읽고
[독후감] 자기개발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읽고
핵심인재 직무역량 중간 레포트 ‘행복한 이기주의자’ 행복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 그들은 남보다 자신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 -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읽고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읽고
스티븐 코비 박사의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읽고 스티븐 코비 박사의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읽으면서 사소하지만 신기한 두 가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과 그것들의 효과에 대.. -
 [독후감]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읽고
[독후감]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읽고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읽고 내가 추리소설을 읽게 된 이후로 가지게 된 책 읽는 습관 중 하나가 밤늦게 서야 스탠드 하나를 켜고 책을 읽는 것이었다. 누가 뭐래도 그래야만이 이 책에 집중이 돼선 굉장히 스릴 있.. -
 [올해최신A+자료]박사가 사랑한 수식 [박사가 사랑한 수식 독후감] 박사가 사랑한 수식 독서 감상문[박사가사랑한수식][서평 박사가사랑한수식]
[올해최신A+자료]박사가 사랑한 수식 [박사가 사랑한 수식 독후감] 박사가 사랑한 수식 독서 감상문[박사가사랑한수식][서평 박사가사랑한수식]
수학을 통해서 인간의 따뜻한 인간애를 조명한 감동적인 책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쓴 독서감상문입니다. A 플러스 맞았던 작품이니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숫자 속에 담긴.. -
 [독후감]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독후감]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을 읽고 ‘박사가 사랑한 수식’ 이 책은 1학년때부터 계속 읽어오던 책이었다. 1학년 때 한 독후감 대회로 인해 처음 읽게 되고 그 후로 그 책의 매력에 푹 빠진 후로부터는 심심할 때마다 읽.. -
 한국수력원자력 회계직 첨삭자소서
한국수력원자력 회계직 첨삭자소서
회계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는 돈에 관계된 직무이기에 기본에 더 충실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한 달간 매 일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예산 관련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