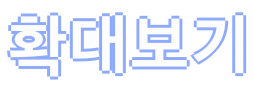송기숙의암태도
송기숙의암태도

송기숙의암태도

송기숙의 암태도’
바다는 따가운 가을 햇살을 재재발기며 팽팽하게 힘이 꼬이고 있었다. 하늘도 째지게 여물어 탕탕 마른 장구 소리가 날 듯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위로는 뭉게구름이 한 무더기 탐스럽게 피어 오르고 있었다.
목포 서쪽 다도해상에 있는 암태도 앞바다는 송기숙(61)씨의 소설에서 묘사된 바와 여일했다. 비록 소설이 쓰여진 때로부터 16년여, 소설 속 상황으로부터는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고, 달력은 아직 한겨울이라 할 2월 초에 머물러 있었지만, 가을과 겨울의 차이도, 16년 또는 70년의 거리도 그곳의 햇살과 물살과 하늘과 구름을 크게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다만, 실장어잡이를 위해 바다 위에 띄워 놓은 여러십척의 무동력 바지선들만이 여일한 풍경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을 뿐.
겨울의 오전 7시30분. 목포항의 희붐한 여명을 뚫고 길을 나선 고속 훼리호는 1시간 30분의 항해 끝에 어김없이 암태도 남강 부두에 닻을 내린다.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암태운수 소속 지프형 택시에 타고 순식간에 집 대문 앞까지 당도한 동네 아주머니는 아따, 빠르요, 잉. 폴쎄 와부렀소야라며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소설 속에서 대여섯 시간씩 걸리기 일쑤였던 것에 비하면 과연 빨라진 것이다. 그토록 길고도 험한 뱃길을 수백명의 섬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오고 갔던 70여년 전 그때, 이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
바다는 따가운 가을 햇살을 재재발기며 팽팽하게 힘이 꼬이고 있었다. 하늘도 째지게 여물어 탕탕 마른 장구 소리가 날 듯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위로는 뭉게구름이 한 무더기 탐스럽게 피어 오르고 있었다.
목포 서쪽 다도해상에 있는 암태도 앞바다는 송기숙(61)씨의 소설에서 묘사된 바와 여일했다. 비록 소설이 쓰여진 때로부터 16년여, 소설 속 상황으로부터는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지나갔고, 달력은 아직 한겨울이라 할 2월 초에 머물러 있었지만, 가을과 겨울의 차이도, 16년 또는 70년의 거리도 그곳의 햇살과 물살과 하늘과 구름을 크게 바꾸어 놓지는 못했다. 다만, 실장어잡이를 위해 바다 위에 띄워 놓은 여러십척의 무동력 바지선들만이 여일한 풍경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을 뿐.
겨울의 오전 7시30분. 목포항의 희붐한 여명을 뚫고 길을 나선 고속 훼리호는 1시간 30분의 항해 끝에 어김없이 암태도 남강 부두에 닻을 내린다.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암태운수 소속 지프형 택시에 타고 순식간에 집 대문 앞까지 당도한 동네 아주머니는 아따, 빠르요, 잉. 폴쎄 와부렀소야라며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다. 소설 속에서 대여섯 시간씩 걸리기 일쑤였던 것에 비하면 과연 빨라진 것이다. 그토록 길고도 험한 뱃길을 수백명의 섬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오고 갔던 70여년 전 그때, 이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

-
 송기원의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를 읽고
송기원의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를 읽고
시대가 바뀌면 당연히 그것을 담아내는 문학도 바뀌어야 한다. 여기서 '바뀜'이란 문예사조적인 측면이 아닌 창작방법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와 현저하게 리얼리즘이 쇠퇴하고 있다. 그것은 .. -
 작업개요서
작업개요서
암기공법개요서 작업개요서 암기 공법 개요서 공법종류 깊이 또는 길이 굴착방법 상시 kg/cm2, 최고 km2/cm2 예정기압 작업예정인원 작업기간 작업실 쉴드 전체단면적 m2 작업실면적 m2 작업실 천정고 m2 기.. -
 거란과 당나라
거란과 당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는 9명의 군주가 재위를 하는 가운데 218년간 존속을 하였습니다. 당나라는 측천무후가 즉위를 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주로 바꾸는데요 당나라에 대한 역사기록 당나라에 대한 역사기록은 신당.. -
 보일러의 개요
보일러의 개요
제1장 보일러(Boiler) 개요 1.1 보일러의 정의 화염, 연소가스, 기타 고온가스를 이용하여 강철로 만든 밀폐된 용기 안에서 물을 가열하여 높은 온도, 높은 압력의 물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 1.2 보일러 .. -
 핸드폰_자판(한글)의_표준화
핸드폰_자판(한글)의_표준화
핸드폰 자판(한글)의 표준화 한글 글쇠(자판)의 표준화 (1) 두벌식 (2) 세벌식 (3) 자판 구성의 기본 원칙과 제안들 (4) 한 자판의 개발 순서 현재 휴대폰의 한글 입력 방식 (1) 삼성전자(애니콜,에버) - 천지인.. -
 [강력추천] 산업안전보건공단 실제 합격자 면접기출 모음 + 모범답안 70선
[강력추천] 산업안전보건공단 실제 합격자 면접기출 모음 + 모범답안 70선
산업안전보건공단 저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 -
 음식에 숨겨진 놀라운 세상,Rheology
음식에 숨겨진 놀라운 세상,Rheology
「 음식에 숨겨진 놀라운 세상, Rheology 」 해외도전과 체험에 도전한 이유 레올로지(Rheology)라는 학문은 실생활과 매우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논문이나 연구결과는 타 학문에 비하여 미비합니다. 반면에 북유럽.. -
 정한숙의 소설 금어(金魚) 감상
정한숙의 소설 금어(金魚) 감상
정한숙의 소설 금어(金魚) 감상 정한숙의 단편 소설 금어는 민족의 시련이라는 동일한 시간대와 사찰이라는 동일한 공간이 병치시켜 백제 멸망기의 무명의 사찰을 배경으로 삼아 삼존 천불상은 이루어지고, 광복.. -
 신경숙의 글에 대한 연구
신경숙의 글에 대한 연구
작가소개 1963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서울예전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였다. 1985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중편 <겨울 우화>가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등단했으며 그 이후 감각적이고 섬세한 필치의 소설.. -
 [비평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비평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비평문]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고 [엄마를 부탁해]는 신경숙의 장편소설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아픔과 소중함을 흡입력 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이 소설은 특히 시점이 일치하지 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