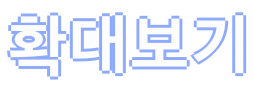윤대녕
윤대녕

윤대녕

윤대녕-천지간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구요,로 첫 말을 하는 윤대녕의 소설. '천지간'은 죽음 앞에 납작 엎드리러 가는--문상가던 중인 주인공이 '산죽음'과 어깨를 부딪히고 말아서 이 곳, 구계등까지 오고 말았다는 어찌보면 작은, 또 어찌보면 아주 큰 우연으로 시작한다.
얼핏 보면 너무나도 꾸며진 것만 같은 이 '우연'으로 인한 사건을 통해 작가는 삶과 죽음에 대해 묵묵히 풀어내린다. 심사평을 보니 이 '우연'이란 것의 작위성 때문에 소설의 맛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다, 이 '우연'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작위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리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렇지 않은가, 예견된 일들보다는 예견되지 않는 일들이 더 큰 몫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운명이라는 것을 바꾸어 놓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감상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소설의 짜임새 상 이 시작은 아주 절묘한 것으로 보여진다.
....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구요,로 첫 말을 하는 윤대녕의 소설. '천지간'은 죽음 앞에 납작 엎드리러 가는--문상가던 중인 주인공이 '산죽음'과 어깨를 부딪히고 말아서 이 곳, 구계등까지 오고 말았다는 어찌보면 작은, 또 어찌보면 아주 큰 우연으로 시작한다.
얼핏 보면 너무나도 꾸며진 것만 같은 이 '우연'으로 인한 사건을 통해 작가는 삶과 죽음에 대해 묵묵히 풀어내린다. 심사평을 보니 이 '우연'이란 것의 작위성 때문에 소설의 맛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다, 이 '우연'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작위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리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그렇지 않은가, 예견된 일들보다는 예견되지 않는 일들이 더 큰 몫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운명이라는 것을 바꾸어 놓지 않는가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감상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소설의 짜임새 상 이 시작은 아주 절묘한 것으로 보여진다.
....

-
 가상공간으로 회유하는 은어떼를 찾아서
가상공간으로 회유하는 은어떼를 찾아서
가상공간으로 회유하는 은어떼를 찾아서 ― 윤대녕論 시신이 묻혀질 땅이 아닌, 영혼이 묻혀질 땅 …… 그의 땅, 그들의 땅…… 다시는 그들을 이민으로도, 난민으로도 만들지 않을 그들의 땅, 그 역시도 그것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