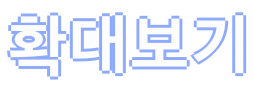광복 전후의 우리 문단 개관
광복 전후의 우리 문단 개관

광복 전후의 우리 문단 개관

광복 전후의 우리 문단 개관
1. 머리말 ― 광복 직전의 우리 문단
진정한 뜻으로서의 우리 문학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옹골차게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펴낼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특히 1937년 7월 7일에 일어난 중일 전쟁 전후 무렵의 우리 문학은 완전히 순수의 너울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겠다.
물론, 1939년 2월 1일에 창간된 문장지나, 역시 같은 해 10월 1일에 창간호를 낸 인문 평론지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두 문예 잡지는 저마다 문학사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여기저기에 친일적인 발언이 서슴없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령, 문장 제1집 권두언을 보면 <일로 전시에는 전쟁이 끝나도록 연구실에만 묻혀 있다가 승전 호외를 보고서야 비로소 조국에 전란이 있었음을 안 학자가 있었다 하거니와 …… 문필인은 이러할 수 있는 학자와는 근본적으로 별개의 문화인인 것이다. …… 이제 동아의 천지는 미증유의 대전환기에 들어 있다. 태양과 같은, 일시 동인(一視同仁)의 황국 정신은 동아 대륙에서 긴밤을 몰아내는 찬란한 아침에 있다. 문필로 직분을 삼는 자, 우물안 같은 서재의 천정만 쳐다보고서야 어찌 민중의 이목(耳目)된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모름지기 필봉을 무기삼아 시국에 동원하는 열의가 없이 안될 것이다>1)1) 「卷頭에 --- 時局과 文化人 ---」, 文章, 1939년 2월호, 1쪽.
라는 말이 나오는데, 벌써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친일적인 빛깔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
1. 머리말 ― 광복 직전의 우리 문단
진정한 뜻으로서의 우리 문학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고 옹골차게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펴낼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특히 1937년 7월 7일에 일어난 중일 전쟁 전후 무렵의 우리 문학은 완전히 순수의 너울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겠다.
물론, 1939년 2월 1일에 창간된 문장지나, 역시 같은 해 10월 1일에 창간호를 낸 인문 평론지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두 문예 잡지는 저마다 문학사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여기저기에 친일적인 발언이 서슴없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가령, 문장 제1집 권두언을 보면 <일로 전시에는 전쟁이 끝나도록 연구실에만 묻혀 있다가 승전 호외를 보고서야 비로소 조국에 전란이 있었음을 안 학자가 있었다 하거니와 …… 문필인은 이러할 수 있는 학자와는 근본적으로 별개의 문화인인 것이다. …… 이제 동아의 천지는 미증유의 대전환기에 들어 있다. 태양과 같은, 일시 동인(一視同仁)의 황국 정신은 동아 대륙에서 긴밤을 몰아내는 찬란한 아침에 있다. 문필로 직분을 삼는 자, 우물안 같은 서재의 천정만 쳐다보고서야 어찌 민중의 이목(耳目)된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모름지기 필봉을 무기삼아 시국에 동원하는 열의가 없이 안될 것이다>1)1) 「卷頭에 --- 時局과 文化人 ---」, 文章, 1939년 2월호, 1쪽.
라는 말이 나오는데, 벌써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친일적인 빛깔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

-
 미군의한반도주군1
미군의한반도주군1
목차 1 . 들어가며 2 . 미군의 한반도 주둔 (1) 주한미군 주둔 역사적 배경 (2) 미군의 주둔 시기 (3) 미군의 철수와 한국 전쟁 3 . 현재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성격 (2) 주한미군의 역할 .. -
 구상초기시연구
구상초기시연구
구상 초기시 연구 -수난의 장․여명도․초토의 시 연작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시인 구상은 1946년 원산문예총이 발간한 ≪응향≫에길, 밤, 여명도 등의 시를 수록한 다음 북조선 문예총의 비판을 받으면서부터.. -
 해방 전후를 읽고
해방 전후를 읽고
이태준 소설 해방 전후 감상 이태준의 소설 해방 전후는 제목처럼 해방의 전후, 서울과 철원을 배경으로 해방 후 지식인의 이념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이 소설은 해방을 전후한 문단의 상황.. -
 국립 경주 박물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국립 경주 박물관,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국립 경주 박물관 분 류 박물관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답사 포인트 1. 신라의 불교문화와 고분문화 관련 유물을 찾아보자. 2. 전시된 유물들을 통해 당시 신라인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보자. Ⅰ... -
 일제시대의 수탈사
일제시대의 수탈사
목 차 1. 서 론 2. 본 론 ① 문화재 침탈 ② 인적자원 침탈 ③ 경제침탈 3. 결 론 1. 서 론 현재는 1997년 7월. 약 한달을 앞두고 있는 57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말고 우리의 채찍으로 삼.. -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경제발전과 전망, 변화, 특징, 현황, 개념, 사례,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경제발전과 전망, 변화, 특징, 현황, 개념, 사례,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의 경제발전과 전망, 변화, 특징, 현황, 개념, 사례,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목 차 경제발전의 뜻 각 나라별 경제발전과정과 전망 한 * 중 * 일 * 미 1. 경.. -
 한국 문학에서의 참여론과 순수론
한국 문학에서의 참여론과 순수론
한국 문학에서의 참여론과 순수론 1. 참여론과 순수론 개요 전후의식의 극복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진폭을 남기고 있는 비평적 쟁점은 문학의 현실참여와 관련된 문단의 분파적 논쟁이다. 전후의 혼란한 현실 속.. -
 10세기 20세기 세계경제, 전간기 개관, 1차대전 직후의 세계경제, 세계대공황, 전후 회복, 경제적 영향,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10세기 20세기 세계경제, 전간기 개관, 1차대전 직후의 세계경제, 세계대공황, 전후 회복, 경제적 영향,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10세기 20세기 세계경제, 전간기 개관, 1차대전 직후의 세계경제, 세계대공황, 전후 회복, 경제적 영향, 특징, 현황, 시사점, 문제점, 미래 전망 조사분석 목 차 I. 전간기 1. 전간기 개관 2. 1차대전(1914-18).. -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작가는 우리 문단에서 가장 정서적이고 문학적인 감성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정평이 나있는 베스트셀러 소설가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 번은 그의.. -
 해방기 시대상황
해방기 시대상황
解放期 時代狀況 Ⅰ. 序論 해방기의 시대현실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左·右의 대립 및 분단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 제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일본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