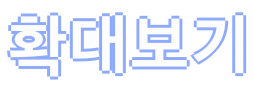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주제발제1.
IMF 구제금융과 한국경제의 미래
김상조(한성대 경상학부 교수)
1. 서론
한국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이후 10여일간의 숨막히는 협상과정 끝에 12월 3일 550억 달러의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가혹한 내용의 구조조정 조건을 담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올해 들어서 재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고 하루에 4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더니,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파산하였음을 공식 선언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MF는 GATT(현 WTO)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여 온 국제기구이다. IMF는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IMF의 구제금융은 그 수혜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에 대한 조정을 강제적인 조건으로 부과하게 되는데(IMF Conditionality), 이것은 구제금융 수혜국의 경제주권이 크게 제약됨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서 경제주권을 IMF에 이양하게 되었고, ‘제2의 국치일’을 맞게 된 셈이다.
한국 경제가 공황(panic) 상황을 맞고 있는 것만큼, 한국의 경제학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조화로운 시장경제질서 하에서는 공황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주류경제학(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은 눈 앞의 현실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장경제질서의 불안정성 또는 그 모순을 주장하던 비주류경제학(포스트 케인즈학파 또는 맑스경제학)은 구체적 대안의 제시라는 현실의 요구 앞에서는 무력감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현실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그 틀이 너무나 좁다.
....

-
 [한국경제발전과 기업경영의 제문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실과 허, IMF구제금융시대의 도래와 원인,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 향후과제
[한국경제발전과 기업경영의 제문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실과 허, IMF구제금융시대의 도래와 원인,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 향후과제
[한국경제발전과 기업경영의 제문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실과 허, IMF구제금융시대의 도래와 원인,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 향후과제 목차 한국경제발전과 기업경영의 제문제 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실과 .. -
 IMF구제금융의배경원인본질내용정부정책
IMF구제금융의배경원인본질내용정부정책
IMF 구제금융의 배경, 원인, 본질, 내용, 정부정책 Ⅰ. 서론 Ⅱ. IMF 구제금융 1. 구제금융의 종류 1) 긴급차입제도 (EFM) 2) 스탠드바이 협정 2.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1) 자금지원 절차 2) 자금지원 규모 .. -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주제발제3. IMF 구제금융과 고용위기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진호(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1. 한국경제의 위기와 그 배경 ○ 최근 기업도산, 고용불안정-->금리급등, 환율급등, 주가폭락-->외화.. -
 한국경제론
한국경제론
- 목 차 - Ⅰ. 서론 Ⅱ. IMF 이전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의 변천 과정 1. 1960년 ~ 1980년 한국형 발전 모델의 형성 및 성숙기 2. 제한적 경제자유화에 의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변형기(81-92) 3. 세계화 추진과 .. -
 멕시코의 IMF 구제 금융 사례
멕시코의 IMF 구제 금융 사례
멕시코의 IMF 구제 금융 사례 1. 멕시코 경제위기의 원인 1994년 멕시코 경제위기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불안과 경제정책의 실패 등이 도화선이 되었다. 경제개혁에서 소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이 19.. -
 한국 외환위기의 발단, 시대적 배경, IMF,원인, 국내 정치 원인, 경제 원인, 대외적 요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구조조정, 정부개혁, 해결 방법, 영향
한국 외환위기의 발단, 시대적 배경, IMF,원인, 국내 정치 원인, 경제 원인, 대외적 요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구조조정, 정부개혁, 해결 방법, 영향
Report ( 한국 외환위기의 발단, 시대적 배경, 원인, 국내 정치 원인, 경제 원인, 대외적 요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 구조조정, 정부개혁, 해결 방법, 영향 ) 목 차 1. 외환위기란 2. 외환위기의 발.. -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구조, IMF, 우리나라 당시상황, 극복방안, 성과, 국외 IMF 사례, 역사, 대책, 특징, 발생, 금 모으기 운동,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구조, IMF, 우리나라 당시상황, 극복방안, 성과, 국외 IMF 사례, 역사, 대책, 특징, 발생, 금 모으기 운동,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구조, IMF, 우리나라 당시상황, 극복방안, 성과, 국외 IMF 사례, 역사, 대책, 특징, 발생, 금 모으기 운동,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1. 들어가며 2. 외환.. -
 유로존 경제위기,아일랜드구제금융현황,유로지역에미치는영향,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
유로존 경제위기,아일랜드구제금융현황,유로지역에미치는영향,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
유로존 경제위기 : 아일랜드 INDEX 아일랜드 구제금융현황 유로지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구제금융 그 이후 입장 및 시사점 1 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 1 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 부동산 버블.. -
 한국 경제위기 논쟁 고찰
한국 경제위기 논쟁 고찰
경제위기논쟁 고찰 '한강의 기적'으로 회자되며 다른 3세계 국가들에게 모델로까지 제시되던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좌초된 듯 보인다. 신화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위기'에 대한 논쟁.. -
 한국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정책 분석,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제점, 현황, 사례, 관리, 역할, 해결방향, 미래 전망, 시사점
한국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정책 분석,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제점, 현황, 사례, 관리, 역할, 해결방향, 미래 전망, 시사점
Report ( 한국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정책 분석,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제점, 현황, 사례, 관리, 역할, 해결방향, 미래 전망, 시사점 ) 목 차 1. 들어가며 2. 본 론 2.1 김대중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