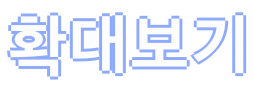신상품의 경제학
신상품의 경제학

신상품의 경제학

'신상품의 경제학' 저자-강원
1947년 벨연구소가 트렌지스터를 발명했다. 이는 전자산업의 극적인 성장을 가져다줬다. 미국은 트렌지스터를 바탕으로 메인프레임과 같은 산업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의 소니는 달랐다. 휴대용 트렌지스터 라디오라는 일반재로 승부를 걸었다. 당시 유행하던 로큰롤을 듣는 젊은이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소니는 1957년 미국시장을 강타한 히트상품을 출시한 이래 60년대까지 미국 라디오 제조회사들을 전멸시키다시피 했다. 곧이어 컬러TV와 VTR 등으로 세계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80년대에도 워크맨, 게임보이, 캠코더 등 전자제품을 계속 내놓았다. 일본은 80년대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을 석권했다. 이른바‘저팬 파워’가 가전과 기계산업에서 새로운 일반재를 잇달아 선보이며 국제무대를 휩쓸었던 것이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컴퓨터 등 IT기술을 산업재로만 사용해온 미국이 일반재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그 결과 회사용 메인프레임이 가정용 PC로 바뀌었고 군사용 인터넷이 일반용으로 변했으며 자연히 PC용 소프트웨어가 발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반도체와 PC를 제작하긴 했지만 반도체에서는 한국과 대만에 따라잡혔고 PC는 미국 제조사들에게 밀렸다. 이동통신도 일본열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IT기술 대중화에서는 일본보다 미국이 월등히 뛰어났다. 이 시기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품이나 기계 등의 생산재보다 최종소비가 가계에서 이뤄지는 일반재 신상품이 산업을 주도하고 경제발전을 선도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

-
 창업아이템 개발 전략(신상품의 3요소, 아이템과 시장의 결합관계 분석, 업종선택시 고려사항)
창업아이템 개발 전략(신상품의 3요소, 아이템과 시장의 결합관계 분석, 업종선택시 고려사항)
창업아이템 개발 전략(신상품의 3요소, 아이템과 시장의 결합관계 분석, 업종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레포트 자료. 창업아이템 개발 전략(신상품의 3요소, 아이템과 시장의 결합관계 분석, 업종선택시 고려사항) .. -
 신상품의성공과실패의원인은무엇일까
신상품의성공과실패의원인은무엇일까
.. -
 [마케팅] 신상품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마케팅] 신상품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 -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INDEX 2. 예술경제학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예술의 경제적 측면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3. 예술에 대한 경제학자의 시각 1. 함정과 가능성 4. 동태적 측면 5. 결론 개인주의의 결.. -
 신관광상품의 개념과 개발요인
신관광상품의 개념과 개발요인
신관광상품의 개념과 개발요인 목차 Ⅰ. 신관광상품의 개념 1. ‘새로움’의 관점 2. 상품개발전략과 신상품의 결합에 따른 견해 3. 시간에 따른 견해 4. 시장점유율에 따른 견해 Ⅱ. 신관광상품의 개발요인 1. .. -
 신상품 개발전략과 개발과정
신상품 개발전략과 개발과정
본 자료는 신상품 개발전략(신상품의 유형, 신상품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신상품 실패원인과 대책, 신상품 개발전략 유형)과 신상품 개발과정(아이디어 개발, 상품 컨셉 개발과 테스트, 마케팅전략 개발, 사업성.. -
 [신상품 개발전략] 신상품개발의 중요성과 절차
[신상품 개발전략] 신상품개발의 중요성과 절차
[신상품 개발전략] 신상품개발의 중요성과 절차 목차 *신상품 개발전략 Ⅰ. 신상품개발의 중요성 1. 신상품의 유형 2. 신상품개발의 필요성 Ⅱ. 신상품개발의 절차 1. 아이디어 창출 2. 아이디어 선별 3. .. -
 상품수명주기와 신상품 개발,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상품수명주기와 신상품 개발,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상품수명주기와 신상품 개발 CONTENTS 제9장 상품수명주기와 신상품 개발 - 제1절 상품이란 무엇인가 - 제2절 상품수명주기 - 제3절 신상품의 개발 제1절 상품이란 무엇인가 P. 281 일반적인.. -
 [여행상품기획] 여행상품 개발의 과정과 고려사항
[여행상품기획] 여행상품 개발의 과정과 고려사항
[여행상품기획] 여행상품 개발의 과정과 고려사항 목차 여행상품의 기획 Ⅰ. 여행상품개발의 중요성 Ⅱ. 여행상품개발시 고려사항 1. 기업여건 2. 시장성 3. 연속성 4. 장래성 Ⅲ. 여행상품개발의 과정 1. .. -
 촉박한기한을지켜준것에대한감사
촉박한기한을지켜준것에대한감사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감사 / 1page 제목 촉박한 기한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 요약 촉박한 기한을 지켜 원단샘플을 보내준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의 내용..

 소니경영,SONY,기업다각화,사업다각화,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소니경영,SONY,기업다각화,사업다각화,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동양제과 ABC 사례 [동양제과 ABC 특징, 동양제과 ABC 사례, 동양제과 ABC 소개, 동양제과 ABC 조사, 동양제과 ABC 개요, 동양제과 ABC 개관, 동양제과 ABC 피피티,
동양제과 ABC 사례 [동양제과 ABC 특징, 동양제과 ABC 사례, 동양제과 ABC 소개, 동양제과 ABC 조사, 동양제과 ABC 개요, 동양제과 ABC 개관, 동양제과 ABC 피피티, 일본 기업 - 소니의 몰락
일본 기업 - 소니의 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