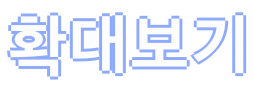그러나나는살아가리라
그러나나는살아가리라

그러나나는살아가리라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책읽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꼽는 책은 매력은 바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한 경험 혹은 작가의 머리속에 있는 상상을 함께 공유하며, 나도 그 속에서 웃고 울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이 책의 장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분명히 산문집이라기에 - 내 머리속에 이처럼 많은 고정관념이 숨어있을 줄이야....- 편한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를 옆이 끼고 책장을 넘겼었다. 그러나 책장수가 넘어갈수록 작가가 담담하게 내뱉어 놓은 많은 경험과 삶의 어두움이 커피가 식도록 나를 집중하게 했으며, 지루하지 않게 간간히 고개를 내미는 작가 특유의 어투가 베어져 있는 시는 '이것이 시집인가'할 정도로 다른 산문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냄새를 풍겼다.
이책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가의 누나에 대한 기억을 정리한 누님의 겨울이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기도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도 이렇게 한평생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삶의 무게에 눌리고 삶의 날카로움에 베이고 상처받은 한 여인이 등장한다. 특히 이런 삶이 겨울이라는 배경속에서는 더욱 더 처절해지고 어쩔 수 없어지는 것 같다.
....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책읽기를 권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꼽는 책은 매력은 바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한 경험 혹은 작가의 머리속에 있는 상상을 함께 공유하며, 나도 그 속에서 웃고 울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사실 많이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이 책의 장르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분명히 산문집이라기에 - 내 머리속에 이처럼 많은 고정관념이 숨어있을 줄이야....- 편한 마음으로 따뜻한 커피를 옆이 끼고 책장을 넘겼었다. 그러나 책장수가 넘어갈수록 작가가 담담하게 내뱉어 놓은 많은 경험과 삶의 어두움이 커피가 식도록 나를 집중하게 했으며, 지루하지 않게 간간히 고개를 내미는 작가 특유의 어투가 베어져 있는 시는 '이것이 시집인가'할 정도로 다른 산문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냄새를 풍겼다.
이책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작가의 누나에 대한 기억을 정리한 누님의 겨울이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기도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도 이렇게 한평생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삶의 무게에 눌리고 삶의 날카로움에 베이고 상처받은 한 여인이 등장한다. 특히 이런 삶이 겨울이라는 배경속에서는 더욱 더 처절해지고 어쩔 수 없어지는 것 같다.
....